당신을 닮고 싶다(살구나무아래에서-녹용작업 이야기)
폭염이 한창이던 8월의 어느 날이었다. 한여름엔 한약방에 오는 손님들이 적었다. 가끔 물건 팔러 오는 행상이 오고, 불우이웃돕기 성금해달라고 젊은 대학생도 문을 두드렸다.
주위에 한의원도 많이 생겨, 환갑이 지나신 아버지 한약방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져 있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뒤, 한 아주머니가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더위에 지쳤는지 들어오자마자 마루에 주저앉고는 부채질을 했다.
“우리 애가 외국 가서 녹용을 가져왔는데, 탕약에 함께 넣어줄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냉동된 녹용을 꺼내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엄청 좋은 거라고 하네요. 캐나다에 우리 아들 사는데, 거기서 좋은 거라고 하나에 오십만 원 주고 샀다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녹용을 유심히 바라보다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제가 좋은 것이면 약에 넣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은 품질이 아닙니다.”
아줌마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녹용을 계속 살펴볼 뿐, 아주머니의 얼굴은 살피지 않았다.
“일단 녹용의 피 처리가 잘 안 되었고, 해독이 안되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또 보관상태도 안좋네요. 보통 캐나다산은 엘크입니다. 못쓰는 녹용이에요.”
손님은 이미 얼굴이 붉어져서 눈썹이 씰룩이고 있었다. 애써 진정하고는 말했다.
“에구, 약국 어른, 다른데선 다 넣어주는 데 좀 넣어줘요. 여기꺼 녹용 안쓴다고 그런거에요?”
손님의 말 속엔 가시가 있었다.
“녹용 빼고 지어달라면 지어볼께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 넣고는 달일 수 없습니다.”
“아유 진짜 답답하네. 뭐 고객이 해달라면 그냥 해주지. 왜 이리 답답해요.”
아주머니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가져온 녹용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신발도 구겨 신은 채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핀잔을 준다.
“나 참… 그냥 지어드리면 되는거.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선, 아버지가 고성을 지른다
“당신은 내가 당신 약 지을 때도 그렇게 지어주면 좋겠어? 내가 안먹는거 다른사람한테 주면 당신은 먹겠냐고!”
“아니 당신이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뭐 알아줘요? 당신 농장에 약재랑 나무 심는다고 얼마 전 대출 받은것도 몰라요? 재규 등록금도 내야하고.”
중년의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에게 지지않고 쏘아붙인다.
“그래도 안되는 건 안되는거야.”
단호한 목소리로 혼자 말씀을 되뇌이신다. 왠만하면 환자 원하는데로 약을 지어줄 법도 한데, 당신의 양심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할수 없었다. 아버지의 고지식함은 그러하셨다.
며칠 뒤 대구 약령시에서 약업사를 하는 정사장이 왔다. 아버지의 먼 친척이기도 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함께 한약업사 고시를 함께 보신 분이기도 해서, 두 분은 오랜 인연이 있었다. 또 우리 집에 각종 약재와 녹용을 공급하는 분이기도 했다.
“전약국 잘 지냈나.~ 오늘 좋은 녹용 가져왔다. 이거 함봐라.”
오랜 인연의 정사장은 목소리에 정이 있는 걸걸한 마루였다.
1m에 가까운 크기, 대가 굵고, 색택이 좋아 아직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좋아보였다. 원용(러시아산을 으뜸이라 하여, 원용이라 부른다)이라 불리는 녹용을 두개 가져오셨다.
“정사장 뉴자(뉴질랜드산을 부르는 말)랑 깔깔이도 가져왔나?”
“그거 뭐하게, 전약국 어차피 안 쓰잖아?”
“재규 보여줘야지. 뿔 채 통으로 봐야 공부가 되지.”
정사장은 밖으로 나가 차에서 다시 물건을 가져오셨다. 뉴자는 뿔 채 가져왔고, 깔깔이는 작업을 한 거였다.
“일단 원용부터 함 봐.”
좋은 약재를 가져왔다는 자부심에 정사장의 목소리가 당당했다.
“러시아 알타이에서 나온 햇 녹용이다. 전약국 특별히 좋은거 달라해서 가져온거다.”
이게 좋은 거라며 두 개의 큰 원용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녹용은 일단 큰 게 좋고, 보통 가지가 5가지가 나오는데, 4,5지가 밑으로 붙을수록 좋다. 그러면 대체로 품질이 좋다. 그리고 뉴질랜드산도 괜찬은 편인데, 작고 품종이 다르다. 우리집은 뉴자는 안 쓰고 원용 쓴다. 녹용은 러시아 같이 대륙에서 찬바람 맞으며 자연목초 먹고 자란게 좋은거야. 또 러시아에선 자연 건조시키지, 다른 나라에선 열로 건조시키고.”
정사장이 아버지를 바로 이어 말씀하셨다.
“그렇지, 전약국 앞에선 뭐 녹용가지고 장난 못치지. 재규야 이거 깔깔이인데, 이것도 봐라. 보통 알타이지 역의 러시아 쪽에서 원용이 나고, 중국 쪽에선 깔깔이가 나는데, 좋은 깔깔이는 품질이 괜찮다. 보통 사람들이 중국산하면 품질 나쁠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
깔깔이는 마감이 약간 거칠 뿐, 색깔과 형상이 원용과 크게 다르진 않아 보였다.
“여기 봐라. 녹용 모르는데서 사면, 깔깔이 넣고 원용이라고 장난치는 데도 많지. 이것도 봐라. 릉이 있어. 약간 솟아있는거 말이야. 이게 원용이랑 깔깔이에서 나오는 특징이다.”
“정사장. 바로 잘라보자. 나 이걸로 할게.”
옆에서 녹용을 보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이구. 역시 상품만 고른다니까. 나같은 사람 전약국같은 사람만 만나면 돈 못번다니까.”
“재규야 작두 가져와라.”
약장 옆 빈 공간에 있던 작두를 꺼내왔다. 아버지는 능숙한 솜씨로, 가지를 절단하고, 남은 몸통을 삼등분을 한다. 삼등분 한 몸통을 세로로 또 길게 자른다.
정사장이 먼저 선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색 좀 봐라. 잘 나왔제?”
“정사장, 근데, 여긴 각이 좀 돈다. 이건 가격을 좀 내려야겠다.”
오랜 지인이었지만, 막상 거래에 있어서는 상인답게 신경전을 펼치셨다. 그러면서 약간 농이 섞인 말씀을 하신다.
“전약국. 자네도 잘 알잖아. 대가 크면 각이 좀 도는거다. 뉴자는 각이 잘 안돈다. 이건 커서 그런거야. 좀 봐주라. 대신 여기 봐라. 상대 쪽은 각이 좀 돌아도 내용물이 뽀송하지. 분골만큼은 안되어도..이런건 상대다.”
“각이 없는 걸 가져와야지 좋은 약재상이지. 내가 정사장 믿고 하는걸. 음…가격은 안깍을테니 대신 말이야. 정사장 오늘 바쁜가? 괜찮으면 함께 작업을 좀하자. 저녁에 밥 한끼 사지. 재규 있을 때 해봐야지.”
“뭐 녹용값 깎는 대신 몸으로 봉사하라 카는겨? 허허…그러지. 뭐 오늘 일 없다.”
정사장은 억센 대구 사투리로 정겹게 대답했다.
“재규야 부엌칼 작은 거 가져와라. 그리고 구판장가서 소주도 사와라.”
아버지는 동시에 두 개, 세 개의 심부름을 시키셨다.
“일단 제모부터 하자. 날이 약간 무딘 부엌칼이 낫다. 니도 와서 같이하자. 니 이런거 봐야 진짜 한의사 되는기다.”
정사장님도 아들에게 말하듯이 한 말씀 거드신다.
부엌칼로 자른 녹용의 털부분을 긁어낸다. 모든게 수작업이다. 시간도 제법 걸린다. 약 반시간을 세 명이서 열심히 제모를 하니까, 비로소 털이 벗겨지고, 약간 까만색의 뿔의 내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여기 있는 털은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요.”
대부분은 벗겨졌는데, 몇몇 부분은 마무리가 안되어서 아버지께 물었다.
“이번엔 촛불 준비해라.”
촛불을 켜고, 남은 털 부분을 태워서 없앤다. 신기하게 털 부분이 타면서 정리가 잘 안되었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소주 가져와라.”
이번엔 소주 먹이는 작업이다. 소주를 녹용에 천천히 붓는다. 한 번은 이 방향, 한번은 반대 방향.
“천천히 좀 해라. 니 배탈나서 화장실 가야되나. 뭐 니 여자랑 약속있나?”
정사장님의 농엔 애초 당하질 못한다.
“아닙니다…”
겉으론 웃었지만 몸엔 진땀이 흘렀다. 여러차례 이 주침과정을 반복한후, 마지막엔 소주에 담궈둔다.
“너 집좀 봐라. 난 어르신과 밥 먹으러 갔다 올게, 다녀와서 나머지 작업하자.”
어느덧 해는 지고 있었다. 창문 밖에 두 그루의 무궁화가 보인다. 무궁화는 7월부터 끈질기게 피고 지고 한다. 나름 그 풍성함과 끈질김이 난 좋은데, 어머니는 벌레 많이 생긴다고, 이번만 꽃을 보고 나무를 자르려고 했다. 몇몇 그루 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 앞엔 블록이 깔린 마당이 있다.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성춘형이 낮에 말려놓은 약들을 거둬들이고 있었다.
삼십 분 정도 지났을 무렵. 식사를 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와 정사장은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
이번엔 석쇠로 굽는 작업이었다. 능숙한 솜씨로 굵고 큰 녹용은 한 번 더 자른 후 석쇠에 굽기 시작했다.
“이래야 소독이 되는거다. 소주 넣는 것도 그렇고… 사슴피에 혹시 독소나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막을 수 있다.”
“이제 작두질이다. 니 작두질 할 줄 아나?”
아버지와 정사장님이 번갈아가며 말씀하셨다.
“그럼요.”
난 작두질은 자신 있었다. 먼저 바닥에 신문을 깐다. 작두 나무부분을 왼쪽다리를 괴고 앉아 중심을 잡는다. 녹용절편을 작두의 칼날 끝이 아닌, 몸쪽으로 많이 당겨 위치한다. 그리고 작두 칼날을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고, 약간 안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작두질하는 첫 힘을 가볍게 주되, 무식하게 센 힘으로 누르지 않는다. 한번 결대로 잘리는 느낌이 나면 그대로 아랫 방향으로 힘을 주어 마무리한다.
“야. 너 작두질 할 줄 아네?”
“그럼요. 어릴 때부터 봤는데요.”
“재규야 근데 너 작두질 처음 할 때보다 익숙할 때 더 조심해야 된데이. 잘한다고 자만할 때 꼭 손 한 번씩 벤다.”
세 명이 함께 작두질을 해서, 원형의 얇은 절편으로 만드는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이제 2,3일에 걸친 말리는 작업만 남았다. 방을 따뜻하게 하고, 안채에 녹용을 쭉 깔아놨다.
오후부터 시작해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녹용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녹용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정성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방안 가득히 꽃이 핀 듯 녹용절편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 스스로도 뿌듯했다.
“재규야. 너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어떠냐? 녹용을 이렇게 통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좋은 녹용을 쓸 수 있다. 보는 눈도 생기고, 사기꾼에게 속지도 않는다. 좀 힘들긴 하지만… 생녹용은 말야. 일단 캐나다 쪽은 엘크 품종이라 약에 넣을수가 없다. 국내산도 종이 달라. 사료 먹여서 키운 것이구 날씨가 온화한 편이라, 러시아산에 비할바가 아니다. 더군다나 붉은피가 홍건한 냉동 녹용이 당장 보기좋다고 가져오는데, 피에는 독소가 있을 수 있어. 약으로 쓰려다 오히려 않좋을 수도 있지.”
아버지는 오후부터 계속된 녹용 수치 작업에 작두질하느라, 소주 먹이느라, 머리는 약간 엉클어지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늘 단정한 차림이신 아버지의 와이셔츠 한쪽끝이 바지를 삐져나와 있었고, 양복바지는 구겨지고, 부서진 녹용가루가 묻어 있었다.
담담히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자꾸 바라본게 된다.
며칠 전 녹용 가져왔던 환자를 돌려보냈던 당신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당신을 닮고싶었다.
“살구나무 아래에서” 중에서. 산지출판사 2021
ⓒ 2025 전재규. 본 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5 Jeon JQ.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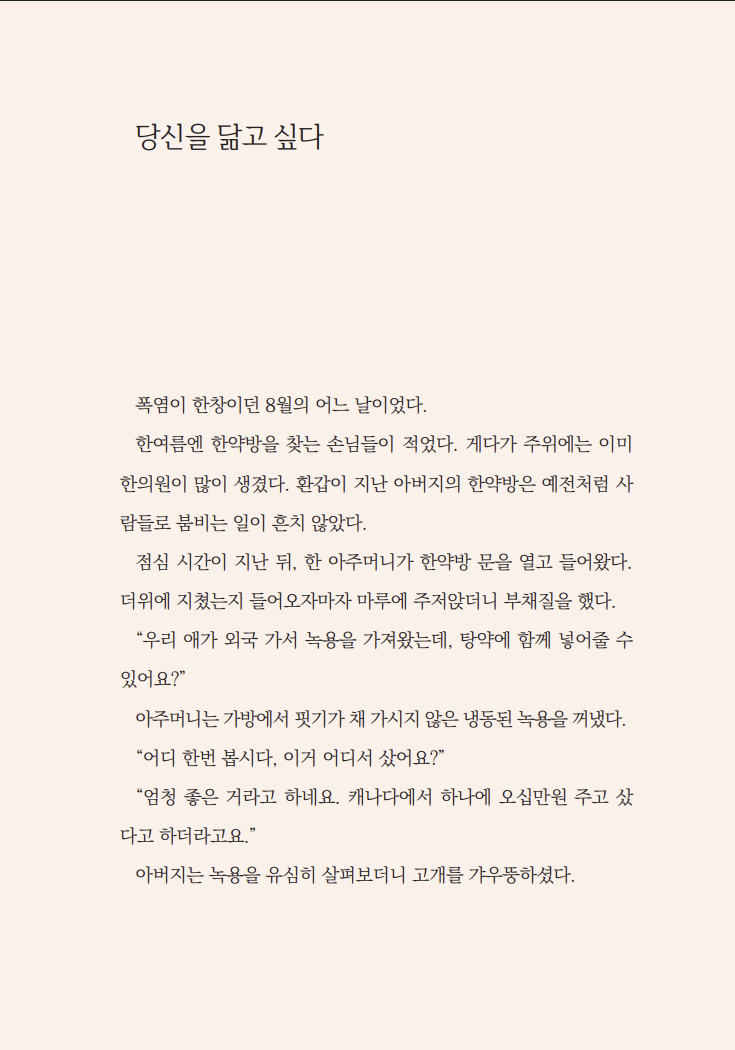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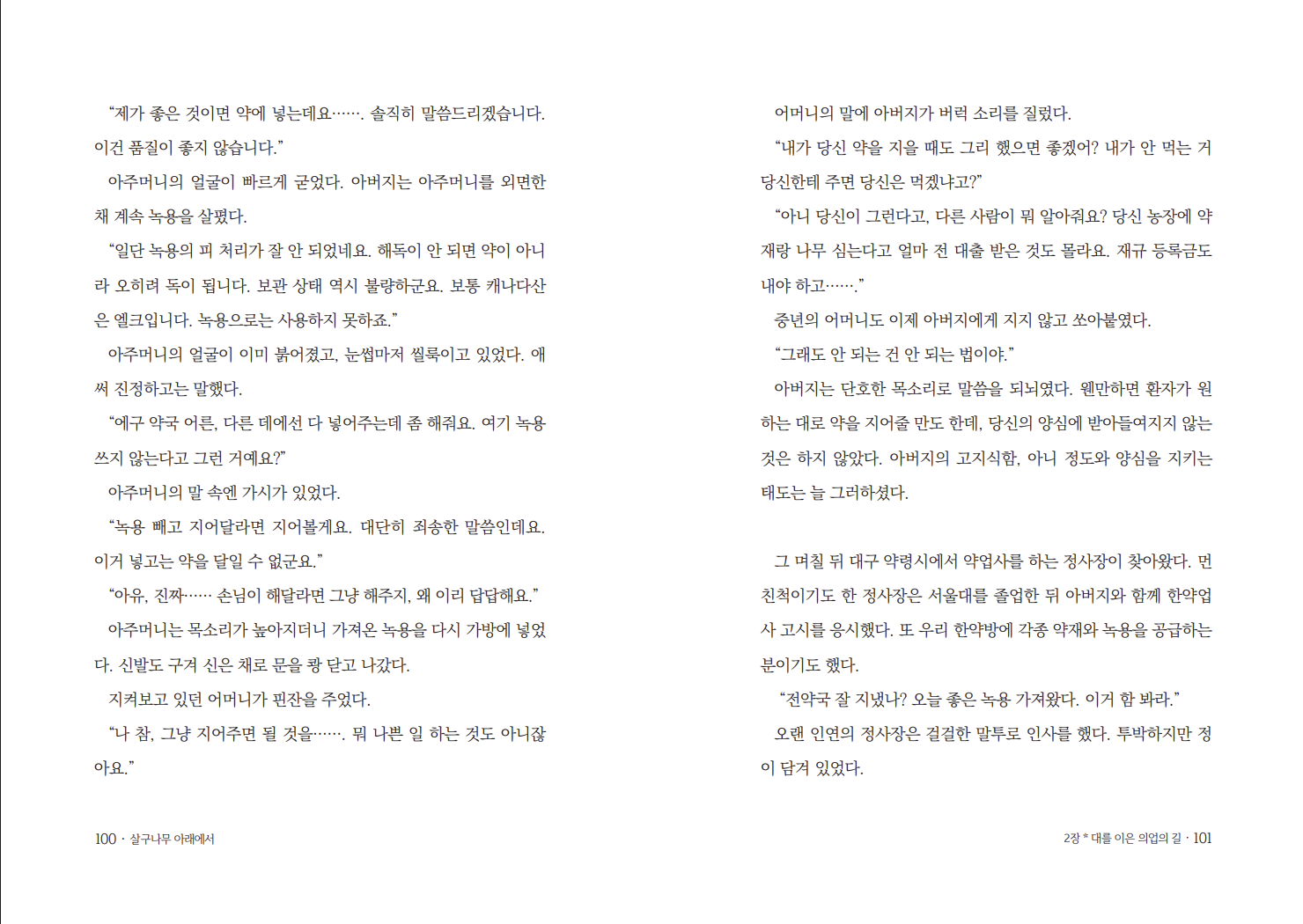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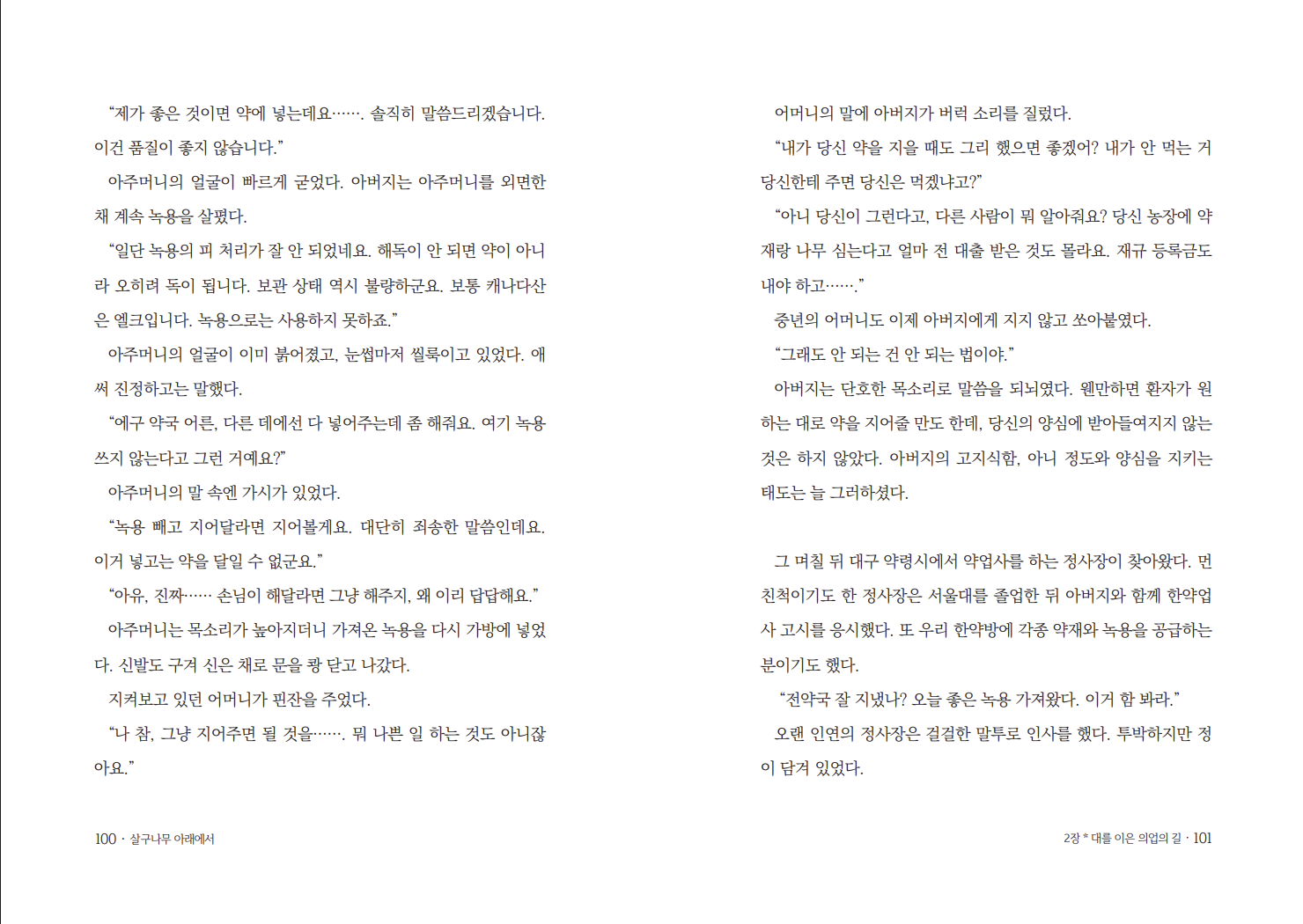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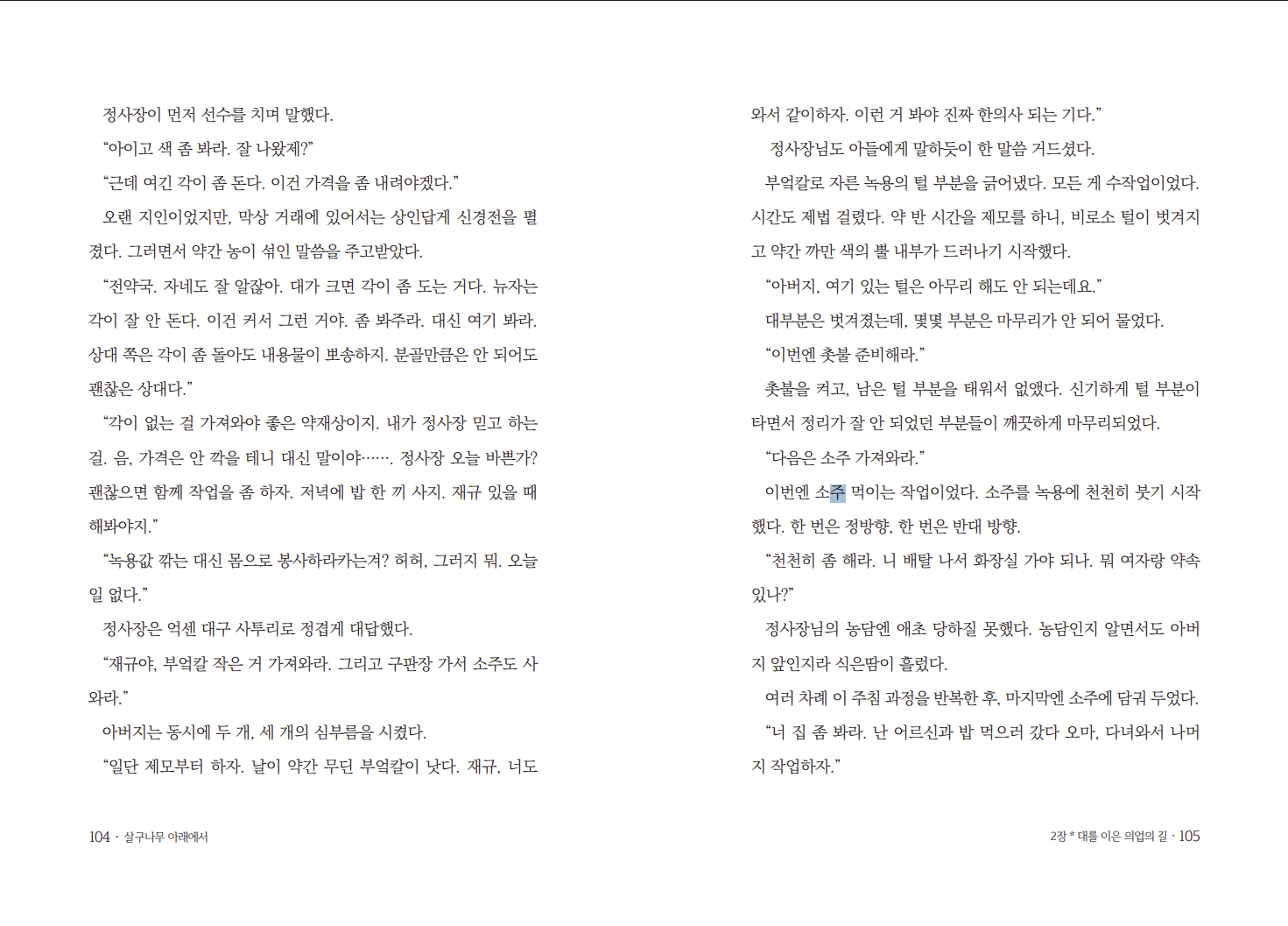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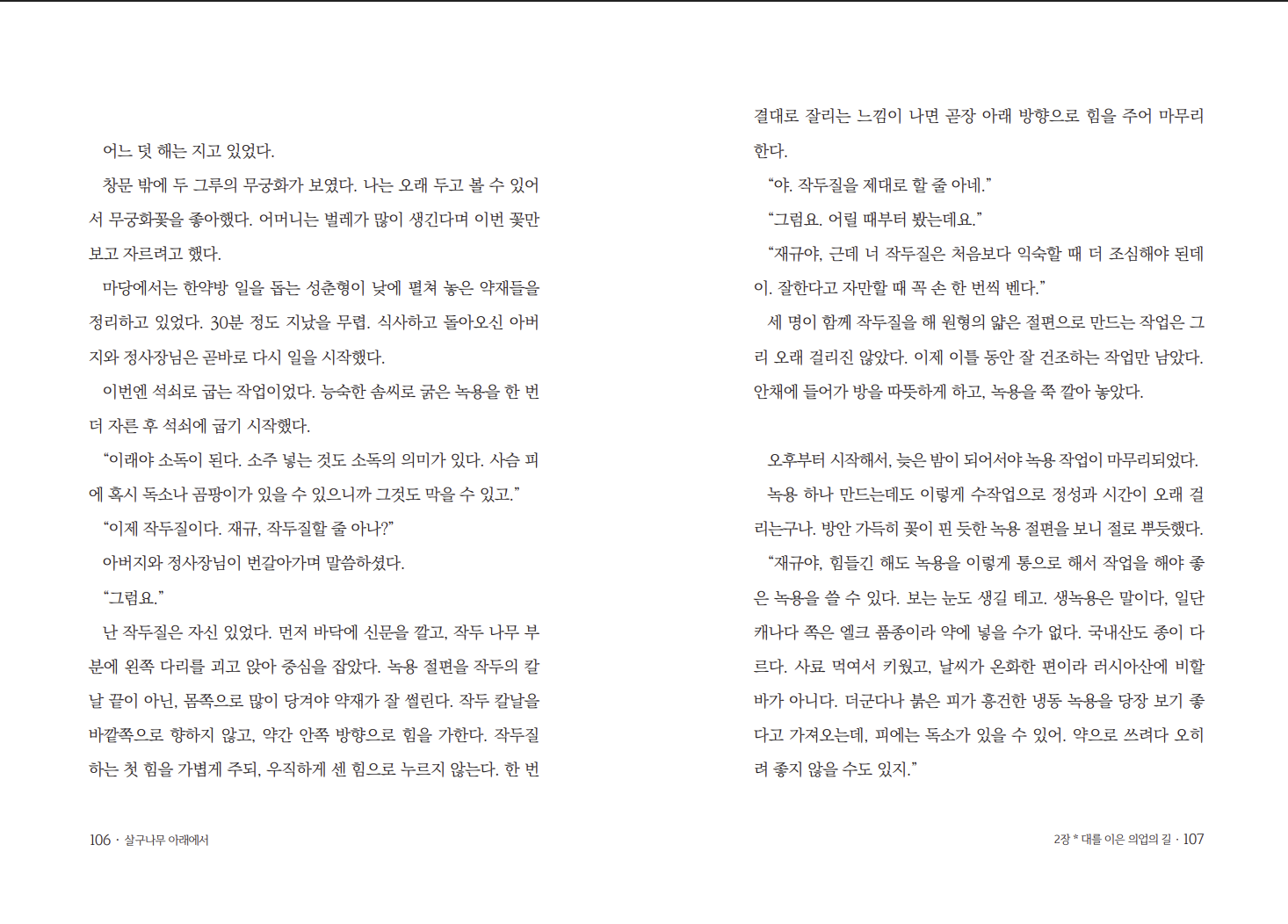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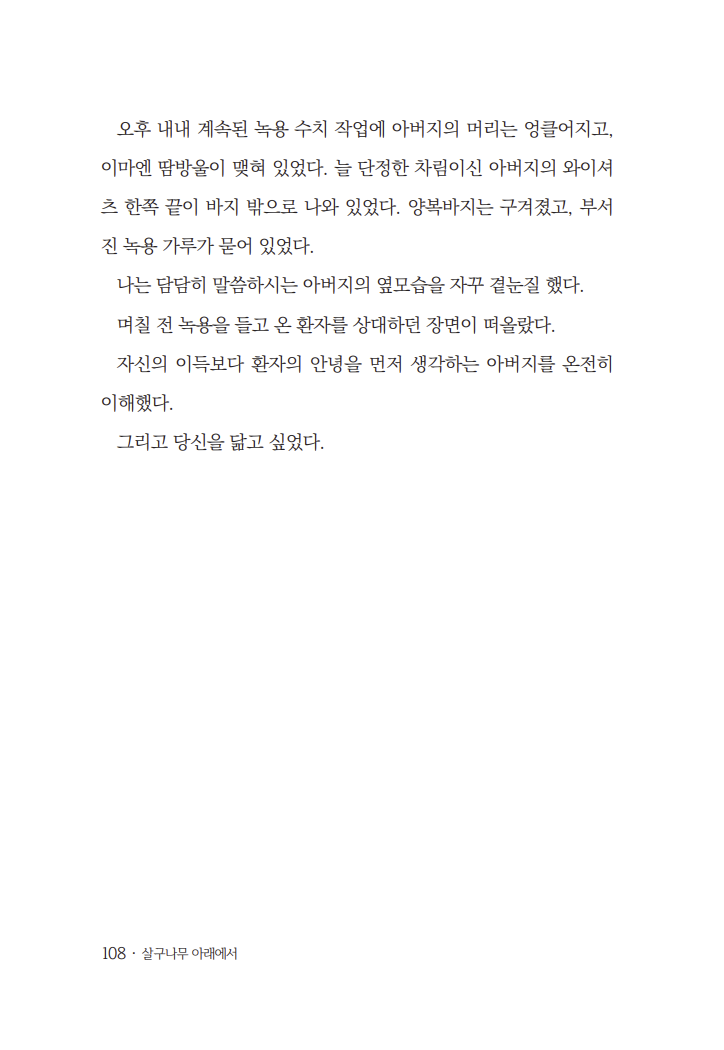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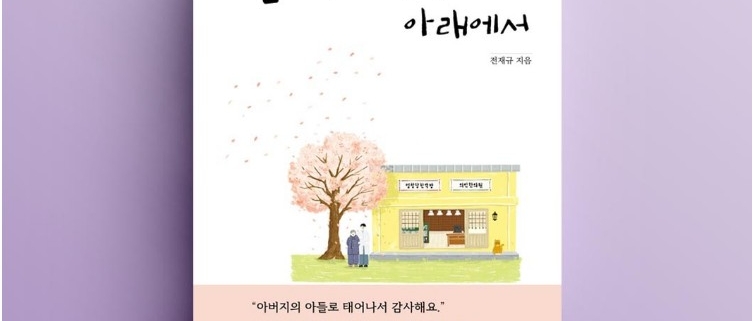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